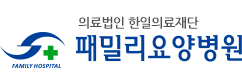[정지아의 할매 열전]우리 동네 미친 할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09:29
조회11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09:29 조회11회관련링크
본문
내 고향 마을엔 미친년이 있었다. 우리 동네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시절엔 동네마다 미친년이 한 명씩 있었다. 신기하게 미친놈은 잘 없었다. 여성이 몇 곱절은 더 힘들었던 시절이라 그랬을 테지 짐작한다. 미친년이라 표현하는 것을 부디 양해하시길. 야만의 시대를 옹호하려 함이 아니니까.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폭로하기 위함이니까.
우리 동네 미친 할매에게는 택호가 없었다. 첩이었던 복이 어매처럼 자식의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도. 이름이든 뭐든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몇 군데 전화를 해봤다.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것 외에 자식의 이름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고향에 내내 살지도 않았던 내가 그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신기해했다. 어찌 기억하지 못할까. 첩보다도 종보다도 더 낮은 존재였는데. 아니,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머리가 새하얗게 세었던 할매는 지금 생각해보니 내 부모 또래였지 싶다. 할매의 막내가 나와 동갑이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도보로 30분쯤 떨어진 윗마을 사람인 미친 할매는 사시사철,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우리 마을 앞을 지났다. 누르스름한 광목으로 지은 똑같은 한복을 입고. 워낙 이른 새벽인 탓에 길 떠나는 할매를 본 기억은 몇 번 되지 않는다.
명절이었을까? 웬일로 일찍 일어나 누군가의 집에 다녀오던 나는 길 떠나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았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엊저녁에 빨아둔 한복이 채 마르지 않았는지 얼어붙은 치맛단이 버석거렸다. 내가 최초로 미친 할매를 미친년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날이기도 하다. 방에 있어도 추위가 뼈에 스며 어른이나 아이나 아랫목만 파고드는 산골의 겨울, 저 할매에게는 얼어붙은 옷을 입고서라도 기어이 가야 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고백하건대 나는 그날 할매의 길 끝에 사랑하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망측한 상상을 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시집와야 했던 고통이,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사랑이 할매를 미치게 했을 거라는 그럴듯한 추론도 했었다. 상상 덕분이었는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멀어지는 할매의 뒷모습이 여느 때와 달리 처연하도록 아름다웠다.
복이와 복이 어매
삐뚤이 할매
할매가 된 엄마
할매는 저녁 밥때가 되기 직전, 시계도 없는데 시계처럼 정확하게 우리 마을 앞을 지났다. 밥을 기다리며 골목에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와, 미친년이다! 고함을 지르며 할매 곁으로 모여들어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다. 아이답게, 잔인하게. 할매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만 응시한 채 묵묵히 계속 걸을 뿐이었다. 한 번도 눈을 부라리거나 발을 구르거나, 어린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다.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할매는 벙어리였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말을 잃게 한 것인지, 원래부터 말을 할 수 없었던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인지는 모른다. 할매는 누군가 막아서면 옆으로 걸었고, 또 막아서면 또 옆으로 걸었다. 걸음을 멈추면 심장이 멈추기라도 할 것처럼. 한둘을 제외하고 동네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잔인한 놀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할매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장난감이었으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할매는 어느 날부턴가 모습을 감췄다. 할매의 막내아들이 아이 주먹만 한 감이 다닥다닥 매달린 감나무에 저도 감인 양 매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였다. 방학 직전 할매는 아들이 다니는 읍내 중학교를 찾아갔다. 미친 와중에도 아들의 얼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까까머리에 교복,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리 속에서 기어이 아들의 얼굴을 찾아내 반갑게 손을 잡아끌었단다. 사람이 아닌,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한 어미의 존재를 친구들 모두에게 들키고 만 어린 아들의 심정을, 고작 빨갱이의 딸이었던 내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움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내 고향은 물론이고 읍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잘생겼던 해사한 아이는, 수줍었으나 뛰어나게 공부도 잘했던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도망쳤던 할매도 물론 세상에 없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나는 모른다.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야만의 시대에는.
우리 동네 미친 할매에게는 택호가 없었다. 첩이었던 복이 어매처럼 자식의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도. 이름이든 뭐든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몇 군데 전화를 해봤다.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것 외에 자식의 이름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고향에 내내 살지도 않았던 내가 그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신기해했다. 어찌 기억하지 못할까. 첩보다도 종보다도 더 낮은 존재였는데. 아니,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머리가 새하얗게 세었던 할매는 지금 생각해보니 내 부모 또래였지 싶다. 할매의 막내가 나와 동갑이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도보로 30분쯤 떨어진 윗마을 사람인 미친 할매는 사시사철,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우리 마을 앞을 지났다. 누르스름한 광목으로 지은 똑같은 한복을 입고. 워낙 이른 새벽인 탓에 길 떠나는 할매를 본 기억은 몇 번 되지 않는다.
명절이었을까? 웬일로 일찍 일어나 누군가의 집에 다녀오던 나는 길 떠나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았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엊저녁에 빨아둔 한복이 채 마르지 않았는지 얼어붙은 치맛단이 버석거렸다. 내가 최초로 미친 할매를 미친년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날이기도 하다. 방에 있어도 추위가 뼈에 스며 어른이나 아이나 아랫목만 파고드는 산골의 겨울, 저 할매에게는 얼어붙은 옷을 입고서라도 기어이 가야 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고백하건대 나는 그날 할매의 길 끝에 사랑하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망측한 상상을 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시집와야 했던 고통이,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사랑이 할매를 미치게 했을 거라는 그럴듯한 추론도 했었다. 상상 덕분이었는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멀어지는 할매의 뒷모습이 여느 때와 달리 처연하도록 아름다웠다.
복이와 복이 어매
삐뚤이 할매
할매가 된 엄마
할매는 저녁 밥때가 되기 직전, 시계도 없는데 시계처럼 정확하게 우리 마을 앞을 지났다. 밥을 기다리며 골목에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와, 미친년이다! 고함을 지르며 할매 곁으로 모여들어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다. 아이답게, 잔인하게. 할매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만 응시한 채 묵묵히 계속 걸을 뿐이었다. 한 번도 눈을 부라리거나 발을 구르거나, 어린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다.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할매는 벙어리였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말을 잃게 한 것인지, 원래부터 말을 할 수 없었던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인지는 모른다. 할매는 누군가 막아서면 옆으로 걸었고, 또 막아서면 또 옆으로 걸었다. 걸음을 멈추면 심장이 멈추기라도 할 것처럼. 한둘을 제외하고 동네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잔인한 놀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할매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장난감이었으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할매는 어느 날부턴가 모습을 감췄다. 할매의 막내아들이 아이 주먹만 한 감이 다닥다닥 매달린 감나무에 저도 감인 양 매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였다. 방학 직전 할매는 아들이 다니는 읍내 중학교를 찾아갔다. 미친 와중에도 아들의 얼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까까머리에 교복,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리 속에서 기어이 아들의 얼굴을 찾아내 반갑게 손을 잡아끌었단다. 사람이 아닌,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한 어미의 존재를 친구들 모두에게 들키고 만 어린 아들의 심정을, 고작 빨갱이의 딸이었던 내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움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내 고향은 물론이고 읍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잘생겼던 해사한 아이는, 수줍었으나 뛰어나게 공부도 잘했던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도망쳤던 할매도 물론 세상에 없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나는 모른다.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야만의 시대에는.